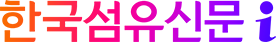좋은 품질, 좋은 가격, 좋은 서비스 잊은적 없고
불모지 韓패션시장 노세일로 정면 돌파
‘폴로 때려잡자’…토탈 패밀리 ‘빈폴’ 육성 앞장

원대연 한국패션협회장은 2006년 ‘가치를 디자인하라’는 책을 썼다. 1980년 삼성물산에 프랑크푸르트 지사장으로 입사해 98년 삼성물산 의류부문장 및 제일모직 대표이사를 맡을 때까지 겪었던 고뇌와 경험을 책으로 엮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을 통해 양(量)에서 질(質)중심으로의 전환과 디자인이라는 화두에 매달려 변혁의 전환기를 온 몸으로 느낀 체험 보고서다.
당시 “돈이 더 들고 지금 당장은 손해 보더라도 멀리보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명제는 대량생산 체제에 매몰된 한국 경제계에 경종을 울리는 일대 사건이었다. 이전까지 삼성은 적어도 한국 최고는 아니었다. 변혁을 강조한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기업 생사를 가르는 혜안으로 판명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불과 4년 후 불어닥친 IMF 사태는 한국 경제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등 2개사를 이끌던 원 회장은 불과 1년 동안 전체 3870명에 이르던 직원을 800명까지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명퇴자를 받고 직영점과 공장, 물류센터로 간부와 임원을 내보냈다.
“800명으로 일이 안될 것 같지만 된다. 당시 패션업체는 생산과 원부자재 납품 프로세스가 복잡해 각 부서는 제 나름대로의 이유로 인원을 늘렸다. 하청이나 협력업체에 맡겨도 되는 일을 우리가 했다. 5명이 하던 일을 이제는 1명이 해내야 하는 것이다.” 원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대학교 패션산업 최고경영자 과정(AFB)에서 ‘가치’와 ‘디자인’에 몰두한 그의 경영 철학을 강의했다.
원 회장은 1992년 12월 삼성물산 패션사업본부장을 맡으며 고민에 휩싸였다. 회사 직원들이 어떻게 세일을 하면 옷을 많이 팔수 있을지를 주제로 밤새 토의하는 모습을 보며 “이 훌륭한 인재 집단이 왜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세계 초 일류 패션기업을 만들겠다는 단초가 제공된 사건이었다.
그는 장기 비전을 세웠다. 제일모직은 1950년대부터 양복지를 만들어 국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원단을 생산한다는 이미지가 있었다. 그는 IMF 시절 이전부터 제조에서 품질 중심으로 가기 위해 “제일모직은 최고급만 만든다”는 기치를 내걸고 전 조직이 한방향으로 가도록 독려했다. 폴로가 대표적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던 때였다.
원 회장은 좋은 품질(Nice Quality) 좋은 가격(Good Price) 좋은 서비스(Best Sservice)를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사장을 그만 둘 때까지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본부장에 올라 대표를 맡는 10년간 전국 매장을 돌며 서비스, 품질, 디자인을 비교하고 모니터링 했다.
다음에는 노세일(No Sale) 정책을 고수했다. 그동안 한국 패션 브랜드 시장은 할인 시장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만큼 시장이 어지러웠다. 신규 브랜드도 6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세일을 안하고는 못버티는 불모지였다. 새로 생긴 브랜드가 매출이 안오르면 다시 세일을 하며 매출을 올리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원 회장은 우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부터 단계적으로 노세일로 전환하면서 신규 브랜드는 무조건 할인을 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가 보기에 제일모직의 빈폴, 갤럭시 캐주얼이 성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보였다. 신사복이 주력이던 상황에서 제일모직은 모든 패션의 캐주얼화를 선언하며 트렌드 리더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현장 인력의 맨파워를 강화했다. 매장 판매사원을 교육해 단품이 아닌 세트 상품을 구성해 판매한다는 전략이었다. 컬러를 다양하게 매칭시키고 멋을 좋아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매출을 높였다.
그의 가치화 전략은 토털화로 마무리된다. “한 개 브랜드라도 똑똑하게 만들면 세계적 브랜드가 된다. 시골에서 부모들이 장남을 위해 소팔고 논밭 팔아 교육시키면 집안을 살리는 기둥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트래디셔널 캐주얼 시장에 눈을 돌렸다. 당시 가장 인기를 끌었던 폴로는 백화점에서 20평대의 큰 매장을 얻어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 때 제일모직 빈폴은 7~8평 규모로 폴로에 비하면 오두막 수준이었다. 마케팅력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폴로는 도심 중심가 대규모 매장에 입점한 반면 빈폴은 초라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현실을 인정하고 10년 중장기 계획에 돌입했다.

그는 “10년 후 국내 최고의 토탈 패밀리 브랜드로 육성하겠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가면 전제품 라인을 모두 살 수 있는 토탈 패밀리 매장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당시 충무로는 상권이 좋아 LG같은 대기업 브랜드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매장들이 빠지고 한산한 거리가 됐다.
그는 빈폴을 키워 10년 후 400평대 플래그십스토어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때 정한 행동 구호가 “폴로를 때려잡자”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좀 더 도전적인 캐치플레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폴로를 비롯한 외국 브랜드를 모두 비교·분석했다. 폴로가 생산하는 공장은 어디인지 원사나 원단은 어떤걸 쓰는지 살펴보고 더 좋은 원부자를 쓰기로 했다. 제품 디자인을 높이고 매장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 고객만족 서비스에 돌입했다. 이른바 ‘백 투 베이직(Back to Basic)’ 전략이었다. 소재와 디자인, 서비스 등 10여개에 이르는 기준을 마련해 경쟁상품과 매 시즌 비교했다. 여기서 3~4개 조건만 미달해도 대책을 세워 고쳤고 이를 임원 승진 고과에 연결시켰다.
이제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었으니 유통전략이 필요했다. 우선 콧대 높은 메이저는 제쳐두고 울산 부산 대구 광주의 지방 백화점들을 공략했다. 반드시 폴로와 똑 같은 평수에 더 좋은 고급 인테리어를 적용했고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예 출점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전략으로 매출을 올리고 평당 매출 효율을 비교하며 메이저 백화점을 설득했다. 메이저 빅3 백화점에 입점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고 결과적으로 대 성공을 거뒀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한 결과 소비자 인지도는 상승곡선을 그렸고 노세일 정책을 고수하면서 판매율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성장가도를 달렸다. 당시 내로라하는 유명 브랜드도 60%를 팔면 꽤 잘한다고 평가받던 시절이었다.
2000년 들어 폴로와의 제 2라운드 대결이 펼쳐진다. 폴로는 그동안 라이센스로 한국에 진출했으나 세계화 전략에 따라 본사가 직접 한국에 진출했다. 그러나 폴로는 여기서 결정적인 헛점을 노출했다.
“옷은 시즌 상품인데 폴로는 납기가 안 맞았다. 우리 제품은 새벽 5시에 나오는데 11시에 제품 나오면 이미 경쟁력에서 쳐지는 것 아닌가. 3월에 만든 옷을 10월에 팔 수는 없지 않은가. 폴로를 잡을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했다.”
그는 장기근속 사업부장을 전격 교체하고 남성복 중심에서 중요 아이템별 사업을 확대해 독립사업부제와 소사장제를 실시했다. 유통을 독립적으로 전개해 매출과 판매율이 급상승하면서 빈폴은 외국 수입 브랜드로 착각할 정도로 고급 이미지 형성에 성공했다. 고객의 70%가 유행에 민감한 10~20대 젊은 층이었다. 가짜 빈폴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빈폴은 그가 계획한 딱 10년만에 확고한 1위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서울대학교 매장에서 쁘렝땅 백화점까지 가짜 빈폴 의류가 버젓이 판매될 정도였다. 당시 국내외 언론은 “토종 브랜드가 말(POLO)을 잡았다”는 기사를 써대기 시작했다.
원대연 회장의 ‘가치 디자인’은 2004년을 끝으로 회사를 나오면서 삼성과의 연을 끊었다. 그는 지금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화두로 새로운 가치 디자인에 몰입하고 있다.
“패션은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문화창조산업이다. 섬유, 봉제는 해외 이전을 하지만 패션은 정보와 보는 눈만 있으면 고부가를 이룰수 있는 지식정보 산업이다. 그런데도 한국패션산업은 지난 40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답답하다. 한 3년 해보고 어렵다고 하지말고 10년을 내다보는 경영이 필요하다.” 그에게 있어 가치 경영이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가 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