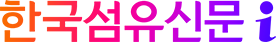더이상 관리되지 않는 쓰레기
…
2018년 200만벌 팔린 롱패딩
그 많던 롱패딩은 어디로

모든 물건의 형태는 그 기능을 따라간다. 구멍을 뚫기 위한 송곳은 뾰족하고, 물을 담는 컵은 오목하고 바닥은 평평하다. 고속으로 달리는 승용차는 유선형이지만, 무거운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해야 하는 대형 트럭은 하중과 충격에 대비해 육중한 직각이다. 대부분 빌딩이 천편일률 직사각형인 이유는 사용 공간을 최적화·최대화하고 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간과 공간을 좀 더 단축하기 위해서, 혹은 필요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획득하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은 유사 이래 온갖 유용한 제품을 만들어 왔다. 제품의 기능과 형태는 그 목적만큼 확장되고 분화되어왔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만들려고만 했지,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소멸은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사용했던 의식주 제품은 우리 손을 떠나는 순간 쓰레기가 된다. ‘유용했던 제품’은 ‘쓸모없는 쓰레기’로 순식간에 신분이 변한다.
쓰레기가 되기 이전까지 제품의 이력은 추적할 수 있다. 식당에서 원산지 표기를 하듯, 모든 제품의 원료 생산지와 노동자, 광고와 판매까지 관련 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있다. 모든 단계와 과정이 이익 창출이라는 목표에 따라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쓰레기로 변한 제품은 더 이상 관리되지 않는다. 제품의 생산과 유통에 투입되었던 복합적 원료와 노동, 수많은 정보와 지식은 통째로 하나의 쓰레기 덩어리가 되어 버무려져 있다. 찰리 채플린의 명작 <Modern Times>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자.
다양한 원료와 부품을 결합하기 위해 노동과정을 분절하고 재배치했던 컨베이어 벨트를 다시 거꾸로 가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쓰레기가 되어 버려지기로 결정된 제품을 다시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고 역으로 되돌려 부품과 원료로 분리해낼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업도, 수많은 사용자로부터 버려진 다양한 제조사의 제품들을 다시 분해하여 수리하거나 부품과 재료를 분리할 시도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 회사에서 만든 제품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생산의 목표는 조립과 완성과 판매이지, 수거와 분해와 해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변덕이 심한 날씨처럼 겨울 옷차림도 어수선하다. 어느 해 겨울엔 추위가 맹렬하여 롱패딩이 거리를 뒤덮었다.
교복처럼 비슷한 패딩을 갖춰 입은 중·고·대학생들의 등·하교 길은 남극 펭귄들의 행진과도 같았다. 하지만 요즘 앞뒤 가리지 않는 날씨 탓인지 롱패딩은 한물가고 숏패딩이 대세라는 광고가 넘친다. 2018년 한 해에만 롱패딩 2백만 벌이 팔렸다고 하니, 유행 주기를 고려해 앞뒤로 계산하면 대략 천만 벌이 전국에 돌아다녔을 것이다. 그 많던 롱패딩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패션은 돌고 돈다고 하지만, 입을 만한 옷도 유행에 뒤지면 옷장에 처박아두고 다시 새 옷을 사는 세태가 바뀌지 않는다. 누구나 헌것은 버리고 새것만 사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은 생산력의 시대를 살았던 16세기 천재 학자 서경덕(1489~1546)은 새로운 물건들이 끝없이 생겨나고, 결국 버려져 쓰레기로 사라지는 현실을 보며 <유물(有物)>이라는 시를 남겼다.
有物來來不盡來 (세상에 모든 것들이 끝없이 생겨나네)
來纔盡處又從來 (새것이 생겨난 다음에도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네)
來來本自來無始 (새로움의 시작이 어딘지 도무지 알 수 없네)
爲問君初何所來 (당신 자신은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아시는가)
有物歸歸不盡歸 (세상 모든 것들이 끝없이 죽어가네)
歸纔盡處未曾歸 (그렇게 사라져가도 아직도 남아 있으니)
歸歸到底歸無了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질 그 날을 도무지 알 수 없네)
爲問君從何所歸 (당신 자신은 어디로 사라져갈지 혹시 아시는가)
지금도 끊임없는 신상품의 등장에 쓸만한 제품들이 사라진다. 그 많은 자원들이 쓰레기가 되고 나면 언제 어떻게 어디로 사라질 것인가.